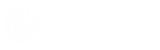불청객
活得不安的我们年轻时的故事 Peter Aser 首张正规专辑 [不速之客] 记得听到彼得·阿泽先生的第一张单曲《回来吧》时,虽然感觉有点无奈,但还是很欣慰。 离开的人把"明洞的那家海鲜店"选为希望回来的地方,因为想到她一直想要的礼物"水彩画颜料"的心情显得非常古典和天真。 화려함이라고는 없는 소박한 장소에 가고, 쓸모를 찾아보기 어려운 선물을 주고받는 사람들의 만남이 어떤 것이었을지를 잠깐 상상했다. 트렌드를 따라가지도 못하고 흥분이나 파격 따위와는 거리가 먼 평범한 나날들이었을지라도, 그들끼리는 ‘함께’하고 있다는 마음만으로 충만한 시간이지 않았을까 감히 짐작해 보았던 것이다. 이후에 내가 피터아저씨를 만났을 때에도 ‘함께’라는 단어는 늘 그들을 따라다녔다. 2014년 6월에 나는, ‘아현동쓰리룸’이라 불리는 그들의 집에서 피터아저씨와 그들의 친구들이 만들어 준 묵밥을 얻어먹고 나서 1m도 안 되는 거리에 관객들을 두고 공연을 한 적이 있다. 그로부터 넉 달쯤 지나 참여한 ‘홈메이드콘서트’라는 이름의 공연에서는, 공연 장소였던 가정집이 워낙 높은 언덕에 위치한 탓에 건반은 물론이고 스피커와 앰프 따위의 장비들을 손수 옮기면서도 즐거운 표정을 하던 그들을 지켜보았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아현동쓰리룸 바로 옆에 ‘언뜻가게’라는 모호한 공간을 마련했다. 아현동 주민들이나 친구들, 그리고 몇몇 공간에 관심을 갖게 된 사람들이 드나드는 카페 겸 식당을 운영하면서, 독서모임, 밥모임, 이따금씩 공연도 열어 오고 있다. 가끔씩 언뜻가게에 놀러 갈 때면 분명 이곳은 서울임에도 불구하고, 도시의 모든 소음과 분주함에서 멀찍이 떨어져 있는 것만 같은 느낌을 받는다.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은 활동을 꾸준히 벌이는 동안, 피터아저씨는 늘 그들이 좋아하고 그들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움직이고 있었다. 음악 자체를 음악가의 삶과 연결하는 게 위험한 일이기는 해도, 피터아저씨가 위와 같은 ‘무용(無用)한 실천’에서 느끼고 경험한 바를 정직하게 그들의 음악에 담으려 한다는 건 부인할 수 없을 것 같다. 전작 [돌아와]와 [옥수수]에서 그 무용한 실천의 유희적인 부분을 특히 강조했다면, 이번 정규 앨범 《불청객》에서는 그런 실천의 의미를 그들 자신과 듣는 이들에게 진지하게 되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되물음은, 2번 트랙 [내 이름을 잊었네] 와 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자신의 이름을 잊은 사람들을 향해, 불현듯 “왜 사냐고 행복하냐고” 3번 트랙 [불청객]을 통해 던진 질문에서 비롯된 일이다. 질문에 대답해 보려 그들이 하는 일은, 1번 트랙 [마음을 열다]를 부르며 닫힌 문을 열고 (너의) 손을 잡거나, 5번 트랙 [길 고양이의 노래]와 같이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다정한 손으로 쓰다듬는 따위의 어쩌면 실용적이지 않은 것들이다. 그와 동시에 행하는 4번 트랙 [멀어져갔네]를 통해 돌아갈 수 없는 멀어져간 한때를 추억하고, 6번 트랙 [요즘 잘 지내냐고]와 같이 지나간 사랑의 미련이 남아서 한숨 쉬는 일들이 과거로의 퇴행을 뜻하지 않는 것은, 그 모든 회상과 반성이 그들이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부단히 오늘을 살고자 하는 기도(企圖)인 까닭이다. 그들이 공연 때 주로 이용하던 구성인 기타 두 대와 그에 얹힌 목소리를 기반으로, 현악과 건반, 일렉기타와 베이스, (팀의 멤버이면서도 공연 때는 잘 볼 수 없던) 드럼 등이 젠체하지 않고 조화롭게 쌓인다. 블루지한 분위기가 흐르는 [마음을 열다]와 [내 이름을 잊었네], 구슬픈 정서가 돋보이는 [그대여] 등의 곡들은 의외의 재미를 주지만, 어쨌든 《불청객》의 많은 곡들은 그들이 그동안 연주했던 ‘포크(-록)’에 기반을 두고 있다. 어쩌면 몇몇 사람들은 피터아저씨의 음악을 조금은 흔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나는 오히려 이들의 음악이 참 오랜만이라는 생각이 든다. 대중(매체)에 알려지기까지 음악가들이 겪은 수많은 난관이 이슈가 되는 지금의 분위기를 생각해보면, 사회적으로 문제 되고 있는 ‘자기 서사의 부재’가 음악만은 비켜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터이다. 그러나 이런 ‘자기 서사의 과잉’은, ‘연대’라는 태도를 잃고 ‘결국에는 성공한’ 음악가상을 강조하고 교조화함으로써 그 반대와 똑같이 공허해지고 말았다. [마음을 열다], [불청객], [부디 오늘만큼은] 등의 곡에서 반복해 등장하는 피터아저씨의 “손잡기”는 그래서 더욱 반갑다. 이들의 “손잡기”는 10번 트랙 [끝]에서 말하는 것처럼 단지 조금의 시간과 공간이 필요할 뿐이므로, 어떤 유용한 성과도 바라지 않으면서 화려한 무대가 아니라 지하철 안에서, 그리고 길 고양이가 떠돌아다니는 아현동 골목에서 오래 지속될 것 같아 보인다. 나는 피터아저씨가 앞으로도 이렇게 ‘무용한’, ‘손 잡는 포크(-록)’를 오랫동안 들려주었으면 좋겠다. 마지막 트랙 [끝]은, 노래가 끝난 뒤에 피터아저씨와 친구들이 나누는 대화를 들려준다. “음악만 했으면 행복했을까?” 라는 질문 뒤에 조금 어이없고 민망하다는 듯이 그들이 웃은 이유는, 좋아하는 일을 한다고 해도 삶이 여전히 힘들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피터아저씨의 1집을 듣는다고 사람들의 삶이 신자유주의의 굴레를 벗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만 이유 없이 세상에 “불청객”처럼 던져진, 이름을 잊은 무수한 삶들을 조금 돌아볼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손을 잡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멋진 일일 것이다. 문득, 오랜만에 언뜻가게에 가서 피터아저씨가 만들어주는 따뜻한 온기가 담긴 카레밥이 먹고 싶다고 생각했다. 거닐숨(음악가, 작가) 피터아저씨 1집 앨범 [불청객]은 CD가 포함된 책의 형태로 출간되었습니다. 앨범은 전국의 소규모 독립서점들과 언뜻가게, 그리고 피터아저씨 페이스북&홈페이지를 통해 구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