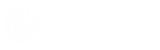영원한 사랑
어둡다. 깊고, 진하다. 아니, 진하다 못해 끈적이는 감정의 진액이 온 몸을 뒤덮는 듯한 기분이 든다. 그렇다. 자우림의 11집 [영원한 사랑]은 (적어도 초반부만 놓고 보자면) 영원한 사랑을 기꺼이 약속하는 앨범이 전혀 아니다. 도리어 그 반대다. 앨범 시작과 동시에 자우림은 몸부림친다. 고통으로 흐느낀다. 가히, 자우림의 어두운 측면을 총체화했다고 결론지어도 과언은 아닐 수준이다. 예술가는 양가적이어야 한다고 믿는다. 그렇지 않나. 삶이라는 건 반짝이면서도 지리멸렬하기 마련이다. 즉, 누군가가 예술가가 되려면 그는 삶을 긍정하는 동시에 혐오할 줄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긍정과 혐오는 극단에 위치한 감정이다. 당연하다. 당신도 알고, 나도 알고, 어쩌면 내 옆집 사는 초등학생도 알 수 있을 진리다. 그리하여 예술가는 서성이는 존재가 된다. 예술가는 긍정과 혐오 중간 어디쯤에선가 서성이는 방식으로 이 둘 모두를 품에 안는다. 그가 이런 태도로 산파한 결과물을 우리는 예술이라 칭한다. 잠시 자우림의 가까운 과거를 복기해본다. [영원한 사랑]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자우림의 첫 결과물이 아니다. 이미 그들은 2020년에 EP 형식으로 [HOLA!]를 발표한 바 있다. 돌이켜보면 [HOLA!]에서의 자우림은 긍정왕이었다. “라 라 라 라 라디오에선/좋아하는 노래/어디로 향해 볼까/네 마음이 흘러가는 곳이면/어디든 데려가 줄게”라고 노래하더니 ‘모닝 왈츠’를 췄다. 당황할 이유는 조금도 없다. 비단 이번만은 아니다. 그들의 역사 전체를 조감해보면 자우림은 삶이라는 명제 앞에서 언제나 우왕좌왕하고 갈팡질팡했다. 단, 우리 같은 일반인과의 차이점은 있다. 우왕좌왕, 갈팡질팡, 서성이는 와중에 예술을 길어 올렸다는 거다. 그러니까, 잊어서는 안 된다. ‘하하하쏭’을 부른 자우림과 ‘스물 다섯 스물 하나’를 부른 자우림은 다른 자우림이 아니다. 데뷔 초기 그들은 ‘일탈’에서 이 지리멸렬한 삶을 탈출할 충격 요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이 모두는 다른 자우림이 아니다. 같은 자우림이다. 설명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될 무렵 오래된 번아웃이 있었다고 한다. “공기에서 먼지 맛이 났고, 아프지 않은 곳이 없었다.” 바로 첫 곡 ‘FADE AWAY’의 감정적인 배경이다. 곡은 마치 깊게 패인 계곡 저 밑바닥으로부터 울려 퍼지는 듯한 보컬로 시작한다. 과연, 가사만큼이나 비애를 품고 있는 목소리다. 이후 곡은 폭발적인 후렴구를 통과해 다시 계곡 밑바닥으로 처연하게 되돌아간다. 제목 그대로 ‘FADE AWAY’다. 그러고는 ‘영원한 사랑’으로 이어진다. 강렬하고, 농염하다. ‘FADE AWAY’와는 그 어떤 각도에서 재봐도 결이 다르다. 요약하면 이 곡은 ‘영원한 사랑’을 믿지 못하는 자의 독백이다. 그것도 강렬하기 그지없는 고해성사다. 그렇기에 곡의 주인공은 ‘STAY WITH ME’에서 지금, 바로, 여기, 있어달라고 요구한다. 말을 경유한 내일의 약속은 그저 허망할 뿐이라고, 영원 따위 필요 없으니 당장 함께 해달라고 애걸한다. 이제 어느 정도 눈치챘을 것이다. 여전히 ‘앨범 미학’을 수호하는 밴드답게 수록곡들은 섬세한 노랫말과 톤 앤 매너로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어 오프너인 ‘FADE AWAY’ 속 단어는 이후 ‘영원한 사랑’, ‘STAY WITH ME’, ‘EURYDICE’,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등과 조응한다. 전체적인 만듦새 역시 거론해야 마땅하다. 서서히 차오르다가 절정을 찍고 다시 썰물처럼 스윽하고 빠지는 구성을 통해 음반은 마무리되는 그 순간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는다. 명확한 컨셉트 하에 앨범을 기획했다는 게 확연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4번곡 ‘PÉON PÉON’의 제목은 아무래도 낯설다. 고양이 이름이기 때문이다. ‘뻬옹 뻬옹’라고 읽으면 된다. 곡은 경쾌한 비트로 고양이의 움직임을 형상화한다. 한데 고양이라고 하기엔 그 생명력이 힘이 넘친다. 가히 사자 뺨칠 수준이다. 어쩐지. 생상스의 ‘동물의 사육제’ 중 ‘서주와 사자왕의 행진’을 이상향 삼아 편곡을 진행했다고 한다. 자우림은 이 곡에서 선천적으로 신장이 좋지 않음에도 활동적인 뻬옹이를 묘사하면서 다음처럼 노래한다. “그 누구도 살아있는 동안엔 춤을 춰야 하는 것이오.” 앨범은 ‘PÉON PÉON와 ‘DADADA’를 기점으로 서서히 표정을 달리한다. 나는 인생의 진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에 녹아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살아볼 만한 것이라고 노래하는 예술가를 유독 편애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결코 무조건적인 긍정이 아니다. 앞서 강조한 것처럼 긍정과 혐오 사이에서 서성여야 겨우 되뇔 수 있을 주문이다. ‘PÉON PÉON’가 그렇고, ‘DADADA’가 그러하다. ‘FEEL PLAY LOVE’ 역시 마찬가지다. 아니, 어쩌면 자우림의 세계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일 수도 있다. 위 세 곡으로 한번 설명해볼까. ‘뻬옹이’처럼 아프더라도 살아있기에 우리는 기쁨의 춤을 출 수 있다. 생명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 ‘FADE AWAY’에서 비록 절망을 토로했지만 그것이 ‘DADADA’에서 표현하는 감사의 마음을 삭제하진 못한다. 세계는 점점 증오와 대립으로 치닫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는 결국 사랑이리라. 바로 ‘FEEL PLAY LOVE’가 담고 있는 노랫말이다. 아직 더 있다. ‘SANDY BEACH’에서 허망한 인생 속 어떻게든 의미를 캐내려 애쓰는 누군가는 그 의미를 ‘잎새에 적은 노래’와 ‘디어 마이 올드 프렌드’에서 찾는다. ‘EURYDICE’는 영어로 하면 유리디시, 통상 ‘에우리디케’라고 부르는 신화 속 인물이다. 신화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처럼 죽음이라는 비극마저 끊지 못한 사랑을 노래한 곡이라고 보면 된다. 이 곡이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로 연결되는 이유다. 원래 게임 음악으로 써진 오리지널을 컨셉트에 맞게 재작업한 곡이기도 하다. 결국 자우림은 영롱하게 반짝이는 ‘EURYDICE’를 지나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에 이르러 희미하지만 간절한 희망을 노래한다. 한데 이 희망, 뭐 거창한 게 아니다. 그냥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곁에 머물러줄 사람이다. 그렇지 않나. 삶의 지리멸렬함은 불가피하다. 그 불가피한 순간을 이겨내게 해줄 사람, 여러 명일 이유가 없다. 아니, 여러 명일 수가 없다. 그저 몇 명이면 된다. 단 한 명이어도 어쩌면 견딜 수 있을 것이다. 마치 꼭 맞는 영혼의 속옷 같은 바로 그런 사람 말이다. 마지막으로 언급해야 할 게 하나 있다. 여전히 빛나는 자우림이라는 밴드의 하모니다. 이건 정말이지 아귀가 척척 맞는다. 다채로운 장르를 무람없이 오고 가면서 밴드 음악이 선물할 수 있는 쾌감의 절정을 찍는다. 때로는 격렬하게 소용돌이치고, 때로는 우아하게 몽상하면서 자우림은 비극과 희망의 경계를 눈부시게 널뛰기한다. 만약 밴드 음악을 예술적인 기품과 기술적인 완성도로 나눠 평가한다면 자우림은 두 영역 모두에서 최고 수준이다. 나는 그들의 라이브를 보면서 단 한번도 실망한 적이 없다. 도리어 감탄하고 또 감탄했다. 곧 보게 될 11집 라이브도 그럴 거라고 확신했는데 이 글을 완성한 바로 오늘 배철수의 음악캠프 라이브를 통해 볼 수 있었다. 어땠냐고 굳이 묻지는 마시라. 밴드 라이브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는 우리 막내 작가가 완전히 반해서 공연까지 가기로 했다는 독후감 정도만 적어둔다. 글, 배순탁 (음악평론가, 배철수의 음악캠프 작가, 배순탁의 비사이드 진행자, 플레이스테이션 트로피왕)